9장. 3. 솜털 날리는 여자
“제 자식놈 운명이 원망스럽습니다, 스님.”
급기야 술명의 입에서는 그런 절망과 한탄의 소리까지 나왔다. 순간, 지금까지 온후해 보이던 보묵 스님이 홀연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들으면 진노하실 것입니다.”
절간 사천왕상같이 무서운 얼굴이었다. 술명의 고개가 부러진 수숫대처럼 팍 꺾였다. 보묵 스님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대신 입 속으로 열심히 염불을 외는 듯했다. 독실한 불제자인 그도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은 것일까? 태양 아래 훤히 드러나 보이는 그의 얼굴에 깊이 팬 주름이 똑똑히 보였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저잣거리에 있는 객줏집에 가는 길인데, 혹시 바쁘지 않으면 저와 동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술명은 그만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다. 나그네들에게 술이나 음식을 팔고 손님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집에 같이 가자니?
“사람이 길을 가면, 중도 보고 소도 본다고 했지요. 빈승이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그, 그러겠습니다.”
조운은 보묵 스님 부탁이라면 아직은 누구에게도 공개하기 싫어하는 그 미완성의 비행기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술명은 했다. 조운은 부모에게도 그 ‘비차’라는 것을 보이길 꺼려했다. 그러나 술명은 볼 수 있었다. 참담하게 망가진 비차의 잔해들을. 그 앞에서 분노하고 절규하는 아들 모습을. 보묵 스님이 발을 떼놓으면서,
“이 나라 백성이면 누구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래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남강을 옆구리에 끼고 나란히 걸어갔다. 조금 아까 선학산 쪽에서 날아온 그 새일까? 유난히 새하얀 몸빛을 한 새가 푸른 물가에 앉아 긴 목을 숙인 채 강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작은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는 새는 나무나 돌로 만든 조형물처럼 비쳤다.
그것은 동네 뒤편 분지에 감옥살이하듯 갇혀 오로지 비차 제작에만 몰두하는 조운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술명의 눈앞에서 그 새가 점점 비차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투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새의 뼈대는 대나무 몸체로, 펼친 듯 접힌 새의 날개는 무명천과 화선지 날개로, 검은 새의 다리는 소나무 바퀴로, 작고 둥근 새의 머리는 솜뭉치로, …….
‘저놈이 왜 빨리 날지 않고 있는 거야?’
술명은 영원히 날지 않을 것처럼 강가에 옹크리고 있는 그 새를 향해 내심 욕설과 저주를 퍼붓다가 나중에는 빌다시피 했다.
‘제발 어서 날아다오, 새야. 네가 날지 않으면…….’
그래도 그 새는 날기를 포기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 순간에는 아니 할 말로, 나는 새를 쏘아 맞혀 떨어뜨린다는 왜놈들 조총이란 게 있으면 당장 그놈을 향해 총알을 발사하고 싶은 술명의 심정이었다.
급기야 술명의 입에서는 그런 절망과 한탄의 소리까지 나왔다. 순간, 지금까지 온후해 보이던 보묵 스님이 홀연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들으면 진노하실 것입니다.”
절간 사천왕상같이 무서운 얼굴이었다. 술명의 고개가 부러진 수숫대처럼 팍 꺾였다. 보묵 스님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대신 입 속으로 열심히 염불을 외는 듯했다. 독실한 불제자인 그도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은 것일까? 태양 아래 훤히 드러나 보이는 그의 얼굴에 깊이 팬 주름이 똑똑히 보였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저잣거리에 있는 객줏집에 가는 길인데, 혹시 바쁘지 않으면 저와 동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술명은 그만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다. 나그네들에게 술이나 음식을 팔고 손님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집에 같이 가자니?
“사람이 길을 가면, 중도 보고 소도 본다고 했지요. 빈승이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그, 그러겠습니다.”
조운은 보묵 스님 부탁이라면 아직은 누구에게도 공개하기 싫어하는 그 미완성의 비행기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술명은 했다. 조운은 부모에게도 그 ‘비차’라는 것을 보이길 꺼려했다. 그러나 술명은 볼 수 있었다. 참담하게 망가진 비차의 잔해들을. 그 앞에서 분노하고 절규하는 아들 모습을. 보묵 스님이 발을 떼놓으면서,
“이 나라 백성이면 누구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래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남강을 옆구리에 끼고 나란히 걸어갔다. 조금 아까 선학산 쪽에서 날아온 그 새일까? 유난히 새하얀 몸빛을 한 새가 푸른 물가에 앉아 긴 목을 숙인 채 강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작은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는 새는 나무나 돌로 만든 조형물처럼 비쳤다.
그것은 동네 뒤편 분지에 감옥살이하듯 갇혀 오로지 비차 제작에만 몰두하는 조운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술명의 눈앞에서 그 새가 점점 비차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투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새의 뼈대는 대나무 몸체로, 펼친 듯 접힌 새의 날개는 무명천과 화선지 날개로, 검은 새의 다리는 소나무 바퀴로, 작고 둥근 새의 머리는 솜뭉치로, …….
‘저놈이 왜 빨리 날지 않고 있는 거야?’
술명은 영원히 날지 않을 것처럼 강가에 옹크리고 있는 그 새를 향해 내심 욕설과 저주를 퍼붓다가 나중에는 빌다시피 했다.
‘제발 어서 날아다오, 새야. 네가 날지 않으면…….’
그래도 그 새는 날기를 포기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 순간에는 아니 할 말로, 나는 새를 쏘아 맞혀 떨어뜨린다는 왜놈들 조총이란 게 있으면 당장 그놈을 향해 총알을 발사하고 싶은 술명의 심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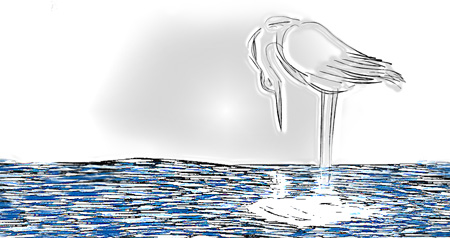 |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